김상용,민법총칙
구민법 시대에도 역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었다.구민법은 그 제167조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의 효과로서 채권 또는 재산권은 10년 또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제145조에서는 '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에 의하여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상호모순되게 규정하였다.그리하여 학설은 이러한 모순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확정효과설과 불확정효과설로 나누어졌다.확정효과설은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권리득실의 효과는 확정적으로 생기고 시효완성의 원용은 이를 재판상의 방어방법으로 해석하는 학설로서 판례가 이 설을 취하였다.이 확정효과설에 의하면 실체관계와 재판 사이의 모순이 생기게 된다....현재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소멸시효에 권리소멸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하여 시효 완성을 직권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변론주의의 원칙에 충실하다.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해서 대부분의 입법례는 시효완성에 대한 권리소멸의 주장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직권으로 이를 고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그리고 진실한 권리는 가능한 이를 보호하도록 하고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권리자의 보호에 충실하지 아니한 견해라고 아니할 수 없다.또한 우리 민법상의 소멸시효 기간은 스위스채무법상의 소멸시효기간과는 대체로 동일하나 독일민법.프랑스민법상의 기간(우리민법은 채권은 10년 그리고 기타 재산권은 20년.독일민법은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0년으로 프랏 민법은 소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스위스채무법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중화민국 민법은 청구권을 소멸시효의 대상으로 하고 일반시효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 비하면 매우 짧다.그러므로 더욱더 권리자의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물론 현행민법의 입법과정 및 법규정에 의하면 절대적 소멸설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지만 상대적 소멸설에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더욱 충실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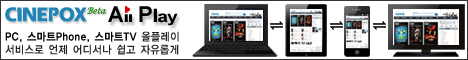
댓글 없음:
댓글 쓰기